
* 복음과상황 195호 (2006년 12월 1일자) 에 실린 전성민 초빙연구위원의 글입니다.
– [195호 신대원 입시 열풍] “모든 성도가 ‘신학교 뜰’을 밟을 수 없을까” : ‘신학교 간다’는 말이 곧 ‘목사’라는 인식 깨져야
지난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열매 중 하나가‘온 신자 제사장’론이다. 특정한 종교 계급의 도움 없이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주장은 지금의 개신교와 가톨릭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되었다. 요컨대 개신교 신자들은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 사제들에게 고해성사하지 않는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죄 용서를 직접 간구할 수 있다.
종교 개혁의 또 다른 결과는 성경을 모든 교인들의 손에 쥐어 주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이 사용되었고, 일반 교인들은 사제들의 성경 해석에 의존하거나 교회의 벽을 장식한 여러 스테인드글라스나 성화들을 통해서만 성경의 이야기를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의 도움과 루터의 헌신으로 인해 성경은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사제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경 읽기의 민주화’는 비록 주관적 해석이라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 ‘과연 그러한가’라고 스스로 성경에 기초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결국 이러한 성경의 대중화와 그로 인한 해석의 민주화는 더 이상 교회의 전통이 아닌 성경 자체가 삶의 기준이 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개신교적 시각에서 보자면 죄 사함에 있어서 사제와 성도의 구분이 없어졌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도 모든 성도들에게 돌아간 종교개혁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라고 믿는다. 그런데, 현재 존재하는 개신교의 제도들 중에서 이러한 종교개혁의 중요한 결과들을 현실적으로는 다시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회자 그룹이 신학 교육을 독점한 것이다. 즉, 신학교라는 것이 목사 양성소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맥락에서 ‘신학교에 간다’라는 말이 가지는 함의는 명확하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던 사람들도 신학교에 가면 전도사가 되고, 신학생 기간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졸업 후 각 교단이나 관련 단체를 통해 안수를 받고 ‘전임 사역자’, 가장 대중적인 단어로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실제적으로 새로운 사제 계급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신학교는 ‘선지동산’이 되어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는 혹은 받은 사람들을 모아 그 주관적 소명 체험을 교육 제도를 통해 공식화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 특별한 계층을 만들어 내고 있다.
나는 첫 신학교육을 캐나다의 리젠트칼리지라는 곳에서 받았다. 그런데 이 학교는 좀 특이해서 자신을 ‘신학교’라고 번역되어지는 seminary라고 부르지 않고 그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unseminary’라는 말을 만들어 학교의 정체성을 표현하곤 했다. 다른 신학교들과 다르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뭐가 다르길래?
필자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학교의 소개 문구를 만들기 위해 동료 교수와 함께 북미의 여러 신학교들의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들을 비교해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의 교육 목표는 하나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church leaders)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유일하게 다른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앞에서 언급한 캐나다의 리젠트칼리지였다. 그 학교만이 교육의 목표를 “하나님의 온 백성(the whole people of God)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in all contexts)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신학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삼고 있었다. 실제로 리젠트칼리지의 신학생들은 그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 여러 방면의 기독 전문인들이 신학적 소양을 쌓고자 학교에 입학한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졸업 후에 자신의 원래 직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입학 전에 의사였다면 졸업할 때도 의사로 졸업한다. 차이가 있다면 2~3년의 신학교육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독교적 관점을 가진 의사가 되어 졸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교육은 그럴싸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부도 마찬가지다. 이삼년 혹은 짧게는 일 년의 과정을 마친 후에는 삶과 일에 대한 신학적 소양을 가진 주부가 되어 졸업하는 것이다. 입학 전의 직업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졸업 후에는 모두 목사가 되는 우리의 그림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림이다.
오리는 태어날 때 본 것을 어미로 알고 따른다는데, 내가 처음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곳이 좀 별난 곳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한국의 신학 교육도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단 신학교들이 자기 교단의 목회자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이러한 교단의 필요에서 좀 더 자유로운 초교파 신학교들은 모든 성도들(소위 평신도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떠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신학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물론 기존의 여러(교단)신학교들에도 평신도들을 위한 과정들이 한두 개씩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이 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사역은 사회 속에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성도들 자신의 사역이라기보다 (담임)목사의 교회 사역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필자가 바라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신학교육은 교회나 목회자의 사역을 돕기 위한 보조적이고 기능적인 훈련이 아니다. 그것은 성도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온전한 사역의 장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모든 맥락 속에서의 사역을 건실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말한다.
신학교 입시의 시절이 왔다. 많은 성도들이 신학교에 갈 것인가 기도할 것이고, 자신의 “소명”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다. 마치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앞에 둔 사람들처럼, 이 시간은 매우 진지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은 덜 심각하게 신학교의 문을 두드릴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치열하고 정직하게 배우고 싶다는 갈망 하나만으로는 신학교의 뜰을 밟을 수 없는 것일까? 모든 사람은 신학자라는 스탠리 그렌츠의 말이 의미 있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신학교의 문을 활짝 열 수는 없을까? 489년 전 시작된 종교개혁이 성경을 모든 성도들의 손에 돌려주었다면, 현대의 종교개혁은 신학교육의 기회를 모든 성도들에게 열어놓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신학교에 간다는 것이 더 이상 목사가 된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를 바란다. 나의 삶과 일의 의미를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쥐어준 성경 속에서 조금은 더 진지하게 찾아보고 싶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기에 충분해야 하지 않을까?
전성민
벤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 /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초빙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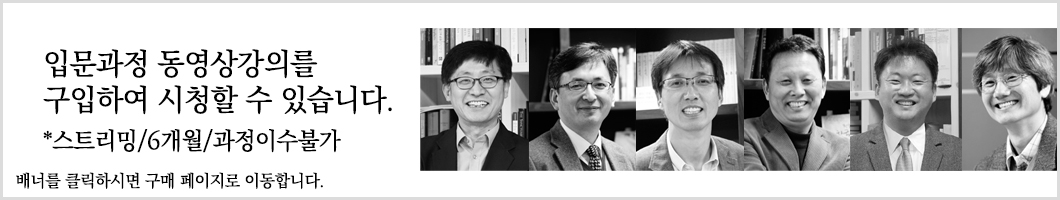
![[웹진 느헤미야] 하나님의 드라마가 우리를 부르는 자리](http://www.nics.or.kr/wp-content/uploads/2016/08/mission-500x383.jpg)
![[웹진 느헤미야] 종교다원주의와 근본주의 – 2부: 한국교회를 향한 제안](http://www.nics.or.kr/wp-content/uploads/2016/08/temple-500x383.jpg)
![[웹진 느헤미야] 종교다원주의와 근본주의 – 1부: 갈등의 역사](http://www.nics.or.kr/wp-content/uploads/2016/08/bad-500x383.png)
![[웹진 느헤미야] 일상생활신학, 그리고 신학교육](http://www.nics.or.kr/wp-content/uploads/2016/08/mon-500x383.png)
![[웹진 느헤미야] 성경적 윤리 없이는 성경적 선교도 없다 – 크리스토퍼 라이트 (전성민)](http://www.nics.or.kr/wp-content/uploads/2016/05/cwright-500x383.jpg)